| 원균의 자업자득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의 지난 출정으로 적선 10척을 깨트렸으나 판옥선은 그보다 훨씬 많은 32척을 잃으면서 전임 통제사였던 이순신과는 180도 다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원균은 이제 와서 부산포 출정이 불가하다며 말을 번복했고, 이순신이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만든 운주당에서 기생을 끼고 술을 퍼마시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도원수 권율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원균에게 곤장을 쳤습니다.

그러자 원균은 분을 못 이겨 전 함대를 이끌고 출정에 나섰습니다.
* 도원수 권율이 원균에게 곤장을 치고 출정을 강요하여 조선 수군을 사지(死地)로 밀어 넣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곤장을 친 이유는 원균이 지난 장계에서 자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다면 부산포를 공격하여 적을 섬멸하겠다며 이순신을 모함했던 일이 있었는데 통제사가 된 후에는 부산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육군 30만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꾸니 조선 조정과 도원수 권율을 기만했다는 괘씸죄를 물은 것이었고, 원균에게 바라는 것은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
원균의 지시로 조선 수군은 한산도 통제영에서 쉬지 않고 가덕도까지 향했고, 그곳에서 물을 싣고, 휴식도 취할 겸 잠시 정박하면서 400명을 먼저 육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에 대기해있던 일본군이 조선군 선발대를 향해 기습을 가하자 당황한 원균은 이들을 모두 버리고 영등포로 도망쳤습니다.
원균이 출정한 이후 조선 수군의 행선지가 연안에 있는 왜성과 곳곳에 있던 일본군에게 바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조선군은 이와 같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시절 마찬가지로 가덕도에서 물을 긷다가 조선군 5명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자 분노한 이순신이 가덕도 왜성(눌차왜성)을 공격하니 고니시 유키나가의 참모 요시라가 포로들을 풀어주었던 일이 있었으니 원균의 무능함이 더욱 부각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영등포로 이동했으나 이곳에서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7월 15일,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자 이를 피하고자 칠천량에 정박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 칠천량 해전
원균은 칠천량에 와서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늘 그랬듯이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순신에게 호되게 당했던 도도 다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의 함대가 칠천량으로 몰려들었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시마즈 요시히로도 자신의 함선을 각각 이끌고 칠천량으로 이동하면서 도합 1천여 척이 넘는 함대가 조선군을 옥죄여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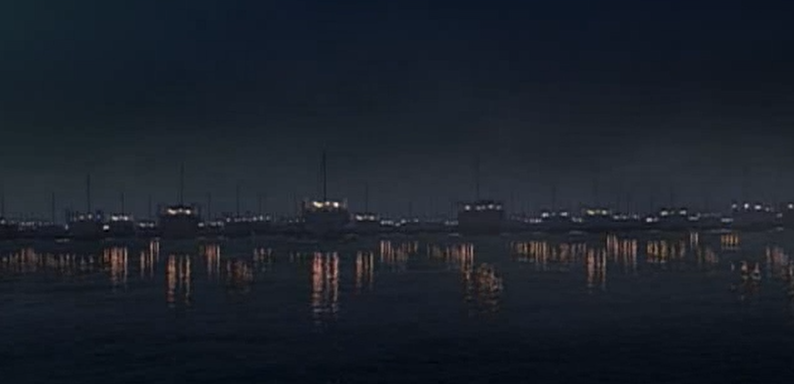
7월 15일 밤, 일본군의 소행으로 조선의 군량선에 불이 붙었고, 이내 수습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순신이었다면 항상 인근에 척후선을 띄워 주변 경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배에 불이 붙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7월 15일, 왜장이 날랜 군졸들을 모집해 작은 배를 타고 우리 군사와 함대의 동태를 살폈다.
우리 병사들이 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으므로 적들이 포 두 발을 발포했다.
우리 군사들은 몹시 당황하여 닻줄을 끊고 어찌할 바를 모르자 적들이 병선을 타고 일거에 진격, 한산도가 마침내 무너졌다.
- [해상록]
밤중에 적이 가만히 비거도 10여 척으로 우리 전선 사이를 뚫어 형세를 정탐하고 또 병선 5~6척으로 우리 진을 둘러쌌는데, 우리 복병의 장수와 군사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날 이른 아침에 복병선은 적에게 불태워 없어졌다.
원균이 놀라 북을 치고 바라를 울리고 불화살을 쏘아 변을 알리는데 문득 각 배 앞에서 적의 배가 충돌하여 총탄이 발사되니 군사들이 놀라서 실색하였다.
- [난중잡록]
위의 두 사료를 종합해보면, 한산도에서 쉬지 않고 노를 저어 가덕도, 영등포, 칠천량을 차례로 이동하면서 군사, 특히 격군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이후로 거듭되는 패배로 인한 군사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계속되는 원균의 무능한 행보가 겹친 데 이어 주변 경계조차 소홀했기 때문에 적군이 아군 진영을 휘젓고 다녀도 모를 정도로 군기는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소수의 적선이 대포 2방을 쏘자 조선 수군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칠천량 해전에 대해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 임진왜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진왜란83] 칠천량 해전의 결과와 원균의 생존 여부 (0) | 2022.06.01 |
|---|---|
| [임진왜란82] 칠천량해전(2)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 원균의 결단 (0) | 2022.05.29 |
| [임진왜란80] 도원수 권율에게 곤장을 맞는 원균 (0) | 2022.02.27 |
| [임진왜란79] 기문포 해전의 전말과 원균의 실상 (0) | 2022.02.21 |
| [임진왜란78]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의 첫 출전! 기문포 해전 (0) | 2022.02.19 |




댓글